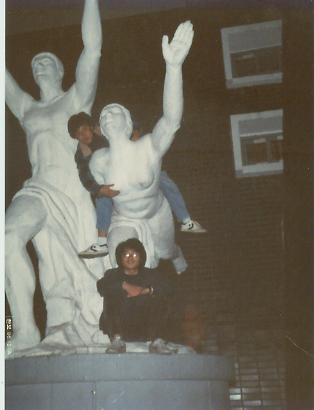신동일(Dongil "Jacob" Shin)은 한국인이 '또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위기와 갈등을 탐구하는 응용언어학 연구자이다.
신자유주의, 단일언어주의, 후기세계화 시대 풍조를 주목하면서 차별의 경험이나 부적절한 관행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언어능력, 언어사용, 언어교육, 언어평가, 언어정책의 의미에 어떻게 개입하고 왜곡하는지 탐구한다. 언어, 영어, 한국어를 둘러싼 문제적 상황을 개인의 결핍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담화/담론, 대화/서사, 언어평가/정책, 언어권리/정체성, 언어감수성/통치성, 다중언어사회에 관한 연구에 다양성, 횡단성, 실용, 자유, 사랑 등의 가치를 보태고 있다.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 언어능력/발달을 평가하는 현장에서 개발, 시행, 타당화, 정책을 연구하거나 시험문화에 관한 평론 활동을 한다. (초)국가 단위의 고부담 언어평가의 사회적 영향력과 가치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 담화/담론(discourse)의 구조, 실천(practice)과 관행(practice)의 속성을 다면적으로 연구한다. 언어와 사회, 텍스트와 콘텍스트, 미시적 언어장치와 거시적 권력구조를 매개하는 담화/담론은 형태/구조, 기능/사용, 사회적 관행/실천 등 다양한 (조합의) 분석이 가능하다.
- 언어통치성(language governmentality), 언어 이데올로기와 주체성, 혹은 자기배려를 위한 언어감수성 교육에 관해 탐색한다. (후기)구조주의 사유로부터 언어사용과 (학습자/수험자) 정체성에 관심을 가진 편이었지만 최근엔 포스트휴먼 문헌과 학교 밖 다양한 문화공간에서 언어통치성과 언어감수성을 탐색하고 있다.
- 경제주의, 합리주의, 기술만능주의, 단일언어주의, 언어결정주의 등에 포획된 언어(평가)정책/계획, 언어위생화(맥커뮤니케이션) 문화를 탐색한다. 링구아 프랑카(접촉), 트랜스링구얼(횡단), 메트로링구얼(도시), 이콜로지 언어환경(생태), 언어복지, (코스모폴리탄/디아스포라) 언어권리 등의 문헌을 조합하여 언어를 자원으로 볼 수 있는 대항/대안 담론을 구축한다.
- 포스트휴머니즘 등의 횡단적 통찰을 기독교 신학의 언어로 번역하고 기독교 세계관 연구와 접목시킨다. 인문대학 교수로 수행한 여러 학술활동을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며, 언어-사회-권력의 문제를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적 인간학, 혹은 창조세계 돌봄의 관점에서 탐구하고 있다.
- 서사(내러티브), 스토리텔링, 대화를 언어능숙도, 페다고지, 연구텍스트, (디지털) 콘텐츠, 사회적 실천, 사고방식, 세계관이나 문화계승의 양식으로 연구하며, 학교, 기업 등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1999년 10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3월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05년 3월부터는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커리어 초반에는 'English Language Assessment', 'Oral Language Proficiency' 분야의 연구와 자문 활동에 주력했고 국가기관, 기업, 학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설계, 채점자 교육이나 채점 프로그램 개발, 말하기의사소통이나 스토리텔링 관련 콘텐츠 기획자로 활동했다.
교수로서 사회적 특권을 누렸다고 성찰하면서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나 소외된 계층을 돕는 프로보노 활동에 시간을 보냈고, 수익형 모형에 휘둘려 높은 가격을 불러주는 입찰자에게 교육적 신념을 숨기는 장사꾼 교수로 일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안식년인 2010년을 기점으로 인문학에 기반을 둔 학제적 활동,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각론을 주목하는 연구, 앎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현실 밀착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연구자 정체성을 마련했다.
지식 활동의 외연을 넓히면서 언어(학습)의 테크놀로지화, 시장과 공리 논리에 잠식된 언어(교육평가)정책, 획일화된 시험준비 문화, 언어통치성과 언어감수성 교육, 위험시대의 언어정체성과 언어권리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개인의 삶을 무력하게 하는 전체주의, 권위주의, 반지성주의, 이항대립의 사회질서, 심지어 파시즘과 다름 없는 세상 단면을 직면하면서, 기독교 세계관, 자유와 사랑, 다양성과 횡단성의 가치를 대안과 대항의 지식으로 수집하고 편집하는 중이다.
"언어는 세상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대상도 아니고 정복하고 획득하는 무기나 도구만도 아니다. 언어는 삶과 세상 그 자체이며 우리와 매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140여편이 넘는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했으며 단행본 20여 권을 저술하거나 번역했고 몇 권은 문화관광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국내외 여러 학술단체, 기업, 정부기관에서 국제협력, 편집, 기획, 재무, 총무, 개발, 자문, 감사 등의 업무를 맡았다. 비영리법인 ACTFL(American Council on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한국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거나, '신동일연구소'를 창업하여 교육평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BK21 PLUS 스토리텔링 사업단장을 맡기도 했다. 최근 몇년 동안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언어 관련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위원이나 여러 교육단체의 자문을 맡으면서 집필 활동만 전념하고 있다.
언어를 관념, 인지, 순수, 단일, 중립, 도구의 속성으로 보지 않고, 생명, 자원, 접촉, 횡단, 실천, 일상성이나 다중성을 포용한 사회정치적이고 생태적인 속성까지 주목한다. 언어는 세상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대상도 아니고 정복하고 획득하는 무기나 도구만도 아니다. 언어는 삶과 세상 그 자체이며 우리와 매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모어가 아닌 또 다른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박제화된 (원어민) 언어를 외워서 마음에 저장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살아 있고 실천하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획일적이고 일방향적인 고부담(high-stakes) 언어시험의 집행, 큰 시험을 준비할 뿐인 (언어)학습(teach-to-the test), 기술지배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속성의 언어정책/계획안을 반대한다. 링구아 프랑카 영어를 포함한 다중적 언어자원에 관한 배치, 언어정체성과 권리교육, 서사와 담화 기반의 언어감수성과 언어정체성 교육, 유학생/이주민/소수자의 언어권리 캠페인, 다양성과 적정성을 배려한 언어(교육)정책과 사회적 캠페인을 지지한다.
Dongil 'Jacob' Shin is a researcher, writer, and Christian scholar whose work explores how languages shape power, meaning, and human dignity. His research seeks the restoration of communication - as an act of grace, dialogue. and shared humanity. For him, researching and writing are both an academic inquiry and a spiritual vocation. He believes that to explore language is to engage with the mystery of creation: the Word that became flesh, and the language that still mediates life, justice, and hope in the world.
How I am aging